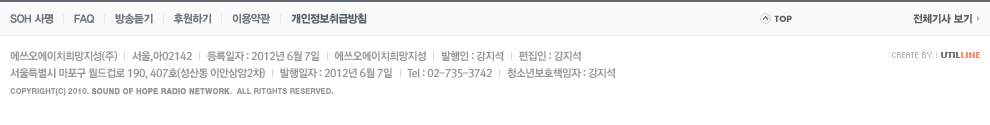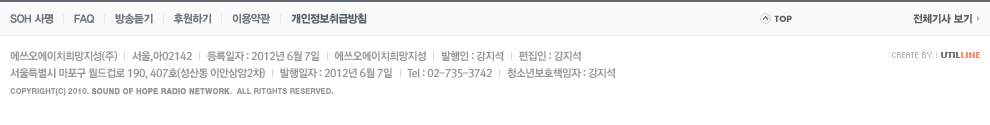[SOH] 중국 고대에는 사직(社稷)으로 국가를 대신 지칭한 경우가 많다. 가령 ‘중국 고대 고유가(儒家)의 경전, 오경(五經) 중 하나인 예기(禮記)의 단궁하(檀弓下)’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나온다.
왕기(汪踦)라는 동자가 전투에 나가 싸우다 죽자 노(魯)나라 사람들이 그의 (葬禮)를 성년(成年)의 장례인 상(殤)으로 치를 것인지 아니면 미성년의 장례로 치를 것인지 의논이 분분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숭고한 뜻을 기리자니 미성년인 것이 마음에 걸렸고, 그렇다고 미성년의 장례를 치르자니 망자에 대한 예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다.
공자(孔子·BC 551~BC479)는 “창과 방패를 들고 사직을 지킬 수 있었다면 성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해도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장례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뜻이 가상하다'는 뜻이었다.
국내에서도 정비석(鄭飛石·1911∼1991)의 글 ‘비석과 금강산의 대화(1963)’에 “태자의 몸으로 마의(麻衣)를 걸치고 스스로 험산(險山)에 들어온 것은 천 년 사직을 망쳐 버린 비통을 한 몸에 짊어지려는 고행이었으리라”고 하여 신라의 마지막 태자인 마의태자의 심정을 묘사했다.
그렇다면 고대인들은 왜 사직이란 단어로 국가를 지칭했을까?
원래 ‘사(社)’란 사회(社會)에서 보듯이 일정한 집단의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는 것을 뜻한다. 중국에서 社는 본래 토지신을 가리켰다.
글자 자체를 풀어보면 신령을 의미하는 시(示)에 토지를 뜻하는 토(土)가 결합되어 토지를 주관하는 신, 또는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 된다.
공자가 엮은 사서인 춘추(春秋)를 해설한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후토(后土); 토지신을 사(社)라 한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직(稷)이란 본래 기장을 의미하는데 ,기장은 상(商)나라나 주(周)나라 시대에 가장 귀한 곡식으로 대접을 받았다. 때문에 곡식을 주관하는 신의 뜻으로도 쓰였다.
결국 사직은 토지신과 곡식의 신을 가리키는데, 사람이 살아감에 땅과 곡식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한 나라가 제대로 서려면 가장 먼저 조상을 받드는 종묘(宗廟)와 땅과 곡식을 주관하는 사직을 세운 것이다.
중국 후한(後漢) 때 역사가 반고(班固·32~92)가 편찬한 ‘백호통(白虎通)’에서는 사직에 대해 “사람은 땅이 없으면 설 수 없고 곡식이 없으면 먹을 수 없다”고 했다.
토지와 식량은 백성들이 생존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해 필요한 기초였다.
특히 중국은 고대로부터 농경(農耕)을 중시해 국가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몹시 컸기 때문에 역대 제왕들은 토지신과 곡신에 대한 제사를 중시했다.
그러므로 고대 중국의 제왕들은 나라가 평안하고 오곡(五穀;참깨·보리·피·수수·콩 또는 참깨·피·보리·쌀·콩)이 풍성할 것을 기원하며 사직에서 매년 큰 제사를 거행했다.
이런 풍습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사직은 바로 국가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사직을 국가로 지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사직을 모시는 전통이 형성됐다. 기록에 따르면 사직을 받드는 제사를 처음 시작한 군주는 고구려(高句麗)의 고국양왕(故國壤王·?-391)으로 391년에 국사(國社)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에서는 선덕왕(宣德王·?~?) 4년인 783년에 최초로 사직단(社稷壇)을 세웠고, 고려(高麗)와 조선(朝鮮) 역시 나라를 세운 이후 종묘와 사직을 건립해 국가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다.
특히 유교(儒敎)를 존중하고 숭상한 조선에서는 종묘사직이 없어지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과 같다고 여겼다.
‘사직위허(社稷爲墟)’란 사직이 폐허로 변했다는 뜻인데 나라가 망해 폐허가 되었다는 뜻으로 썼고, 나라의 안위와 존망을 맡은 중요한 신하를 가리켜 ‘사직지신(社稷之臣)’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편집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