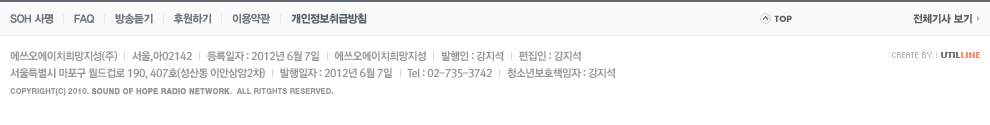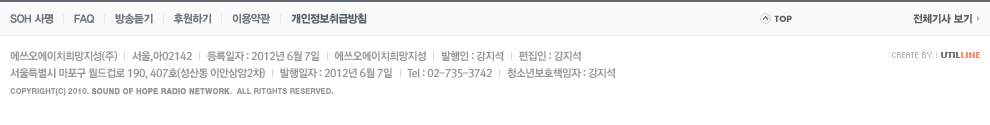[SOH]
손오공은 오장관에서 인삼나무를 뽑아버리다-46회
[SOH] 지난 시간 구름을 타고 삼장 일행을 쫓아온 대선은 그들 무리 앞에서 구름을 낮추었습니다.
대선 : “손오공! 이놈 어디로 도망치는 거냐? 내 인삼나무를 물어내라!”
팔계 : “이런 제길! 원수가 또 찾아 오셨셩.”
오공 : “스승님! 당신의 그 착하신 마음을 잠시 거두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 번 살기를 돋구어 저 도사 놈을 없애치운 뒤에 이 고비를 벗어납시다.”
삼장이 벌벌 떨면서 미처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오공과 두 제자는 각각 손에 무기를 돌고 대선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오공은 진원대선 알아 못보고 여세동군 한결 더 현묘하구나.
세 가지 병기 일시에 짓쳐와도 먼지떨이 의연히 나부끼누나.
앞뒤로 좌우로 오고 가면서 가로막고 내리치며 안고 도누나.
밤도와 걸어도 빠져나갈 길 없으니 머나먼 서천 길 언제면 가랴.
이렇게 세 사람이 대선을 에워싸고 제각기 무기를 휘둘러댔지만 대선은 반시간 만에 먼지떨이 하나로 삼장 일행과 말과 행장까지 소매 속으로 휘몰아 넣었습니다. 오장관으로 돌아온 대선은 삼장과 오정 팔계는 섬돌 아래에 있는 느티나무에 각각 비끄러매고, 오공만은 밧줄로 묶어서 땅바닥에 넘어뜨려 놓고는 선동에게 무명 열 필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오공 : “팔계야! 이 도사는 아주 제법이구나! 무명으로 우리에게 창의를 지어 줄 모양이야! 그냥 부대 같은 옷이라도 상관 없는데 말여."
대선 : “가져온 그 무명으로 먼저 당삼장과 저팔계 사화상을 그걸로 꽁꽁 감고 옻칠을 가져다 무명 위에 바르거라!”
오공 : “헤헤, 이건 뭐 산송장을 가져다 입관시킬 작정인가?”
팔계 : “여보슈. 위통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지만 아래 구멍만큼은 좀 남겨주시구려. 그래야 배설을 하지 않겠숑.”
대선 : “애들아! 이제 큰솥을 가져와 기름을 붓고 장작불을 지펴 기름이 지글지글 끓거든 저 원숭이를 튀기거라! 그래서 인삼과의 원수를 갚자.”
오공 : “이거 마침 잘 됐는데. 오랫동안 목욕을 못해 온몸이 가려워 죽을 지경인데 한바탕 시원하게 목욕이나 해야겠어.”
마침내 기름이 끓기 시작하자 오공은 문득 도가의 술법이 무서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섬돌 아래 돌사자를 자신으로 변신시켜 놓고 자신은 구름 위에 올라 도사가 하는 짓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대선 : “기름이 끓고 있으니 이제 저 원숭이 녀석을 기름 가마에 집어넣어라!”
대선의 분부를 받고 선동 네 명이 달려들어 오공을 맞들었지만 어떻게나 무거운지 스무 명이 들어서야 겨우겨우 가짜 오공을 가마솥에 넣자 철벅! 하는 소리와 함께 펄펄 끓어 번지던 기름이 사방으로 튀어 선동들에게 크고 작은 화상을 입혔습니다.
선동 : “앗 가마가 샌다! 가마가 새!”
불을 때던 선동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기름은 깡그리 새 버리고 구멍 뚫린 솥 안엔 돌사자 하나가 덩실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대선 : “이 원숭이 놈이 참말 무엄하기 짝이 없구나! 감히 내 앞에서 농간을 부리다니! 도망칠 생각이면 곱게 가버릴 것이지 어째서 내 솥까지 깨뜨려 놓는단 말이냐! 정말로 고약한 놈이로구나. 하지만 그놈을 잡는 건 헛수고일 테고, 또 잡는다고 해봤자 그림자를 덮치고 바람을 잡는 거나 다름없는 노릇이지. 별수 없다. 애들아, 새 가마를 내다가 이번엔 삼장법사를 튀겨라. 그래서라도 인삼나무의 원수를 갚자꾸나.”
오공 : “안되겠구나! 스승님이야 저 가마 속에 들어만 가면 당장에 뼈도 추리기 어렵게 돼버릴 텐데. 하는 수 없이 내가 다시 가야겠구나!”
오공 : “그럴 것 없소! 내가 대신 가마에 들어갈 테니.”
대선 : “앗, 너 이 원숭이 놈아! 무슨 짓으로 내 가마를 깨뜨렸느냐?”
오공 : “하하하하, 나를 만나면 운수가 좀 사납게 마련인 거지만 그게 어디 내 잘못이오? 방금 나는 튀김으로 되어줄까 하다가 방정맞게 대소변이 마려워서 잠깐 실례를 했던 거요. 내가 가마 안에서 용변을 하게 되면 기름이 더러워져 요리 맛이 좋지 못할 게 아니요? 이제 용변을 깨끗이 하고 왔으니 가마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을 거요. 우리 스승님을 튀길 것 없이 어서 이 오공을 튀겨주시오.”
세상살이엔 참을성을 길러야 하고
몸을 닦음엔 견딜힘이 있어야 하리.
흔히는 인(忍)자를 생계로 삼게 마련이니
생각을 거듭해 노염을 삼가라.
상사의 너그러움 영원히 전해지고
성인의 은혜로움 당세에 이어지네.
굳센 자 위에 더욱 굳센 자 있다지만
마침내 헛됨과 그릇됨으로 끝나리.
진원대선은 코웃음을 치며 정전에서 내려와 오공의 팔을 거머잡았습니다.
대선 : “나는 네 녀석 솜씨도 알고 있고 명성도 들었다. 그렇지만 이번 일만은 도리에 어긋날뿐더러 사람을 속여먹은 덜된 짓이다. 설령 네가 재간껏 행패를 부린다 해도 결국 내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난 너와 함께 서천에 가서 너의 불조를 만나서라도 나의 인삼나무를 물어내도록 하고야 말 테다. 그러니 부질없이 까불지 말아라.”
오공 : “헤헤헤. 당신도 퍽이나 좁쌀이구려. 나무를 되살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일찍이 이렇게 말했더라면 부질없는 실랑이질은 없었을 게 아니오?”
대선 : “이만한 실랑이질도 없이 내 너를 호락호락 용서해 줄 것 같으냐?”
오공 : “그럼 당신은 우리 스승님의 결박을 풀어주고 나는 당신의 나무를 살려 주기로 하는 게 어떻겠소?”
대선 : “네가 만일 그만한 신통력이 있어서 내 나무를 살려 놓는다면 난 너와 형제의 의를 맺도록 하마.”
오공 : “그건 어렵지 않소. 우선 저분들을 풀어주시오. 난 틀림없이 나무를 살려놓을 테니까.”
대선 : “애들아! 저분들을 풀어 주거라.”
오정 : “스승님. 사형이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팔계 : “꿍꿍이는 무슨 꿍꿍이겠어? 저런 걸 입에 발린 인정이라고 하는 거야. 죽은 나무를 제가 무슨 수로 살려낸다는 거람? 그럴듯한 말로 속여서 자기 혼자 뺑소니치려는 거지.”
삼장 : “제가 우릴 내버리고 가진 못할 거다. 어디 그 내막이나 물어보자꾸나. 오공아! 이리 가까이 와 보거라.”
삼장 : “너는 왜 도사를 속여 우리를 풀어놓게 한 거냐?”
오공 : “제가 왜 도사를 속이겠습니까? 그건 정말입니다.”
삼장 : “그래. 넌 어디 가서 그런 처방을 구할 생각이냐?”
오공 : “좋은 처방은 바다 저쪽에서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 이제부터 동양대해로 가서 삼도 십주를 다 돌아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오랜 신선들과 성인들을 찾아 소생법을 알아올 텝니다. 그래서 죽은 인삼나무를 꼭 살려내고 말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삼장 : “이렇게 떠나면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오공 : “사흘 동안이면 넉넉히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삼장 : “그렇다면 네 말대로 사흘 동안의 말미를 주마. 만약 사흘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난 또 긴고주를 외울 테다.”
오공 : “스승님!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오공은 호피치마를 추슬러 입고 문 밖으로 나와 대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오공 : “내 곧 다녀올 테니 도사께선 안심하십시오. 대신 우리 스승님의 신상을 잘 보살펴 주시오. 날마다 제때에 공양을 차려드리고 옷이 더러워지면 빨아 입히시고, 제가 돌아왔을 때 스승님의 얼굴이 조금이라도 여위었거나 병색이 돌았다간 용서치 않을 것이오.”
대선 : “참! 그 녀석. 잔소리 그만하고 어서 다녀오기나 해라. 밥은 굶기지 않을 테니까.”
대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공은 벌써 근두운을 잡아타고 오장관을 떠나 동양대해로 날아갔습니다. 하늘을 나는 오공은 빠르기가 번개 같고 급하기가 별똥 같았습니다. 어느덧 봉래산 선경에 이르러 구름을 낮추고 경치를 보는데 실로 훌륭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신선의 고향이라 성인들 무리져 있고
검푸른 파도 위에 봉래산이 솟아 있네.
요대의 짙은 그림자 하늘에 차가웁고
큰 대궐의 눈부신 빛발 물 위에 드높누나.
오색의 안개와 노을 옥퉁소 물었는가
구천의 별과 달은 금거북 비치는 듯
요지의 서왕모도 빈번히 이곳을 찾아
세 신선 축하해 선도를 내놓았더라.
오공은 이곳에서 인삼나무를 살려낼 비법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세요.
-2024년 1월 3일-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