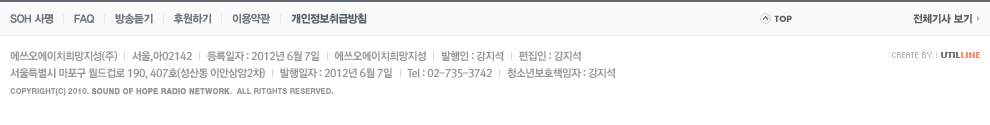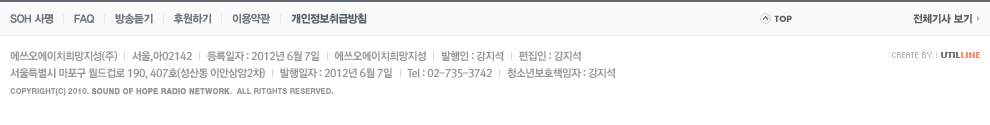[SOH] 올해 상반기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의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9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국경을 열었지만 서방과의 지정학적 갈등 지속, 반간첩법 시행 등에 따른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여행사를 통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5만2000명에 불과했다.
2019년 1분기에 여행사를 통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총 370만 명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관광 수요는 90% 이상 줄어든 셈이다.
이마저도 중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 이상은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중국 본토에 근접한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중국관광협회 이사 샤오첸후이는 지난 5월 "유럽과 미국, 일본, 한국 관광객의 수가 모두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주요 도시도 마찬가지다. WSJ는 "올해 상반기에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한 외국인 수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자국민들에게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국무부는 “중국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현지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없이 영사 서비스도 받지 못하면서 구금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목한 ‘자의적 집행’의 관련 법은 반간첩법(방첩법)이다. 이 법은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됐다고 판단하면 통계 자료 검색 및 저장까지 위법 행위가 된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잣대가 자의적일 수 있는 만큼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서방국가들은 우려한다.
이로 인해 비즈니스 출장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 관련 투자 자문 로펌인 해리스 브릭큰의 파트너 댄 해리스는 “현재 기업들은 중국 출장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WSJ은 관광객 급감으로 인한 관광업 침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국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한상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