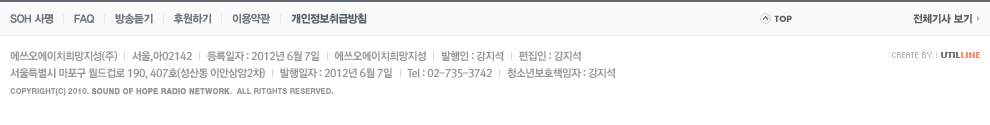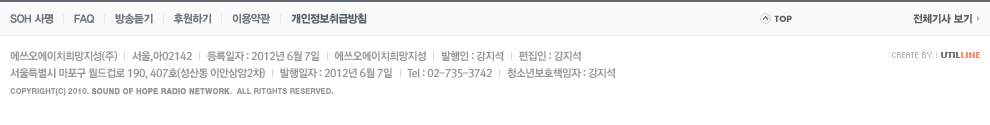"행복하게 해주겠다더니…" 기저귀 사기도 어려운 농촌
지난해 5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 처녀를 소개받고 일주일 만에 결혼을 하고 돌아온 정진수(47, 가명)씨.
뒤늦은 나이에 천여만 원이나 되는 빚을 내 결혼을 하고 왔지만 주변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정씨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돈 주고 사온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면서 "이런 얘기들 때문에 처음에 방황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정말 이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보다 정씨를 더 괴롭히는 것은 경제적 궁핍. 밭농사를 하는 정씨는 벌써 몇 달 째 수입이 없어 아기 기저귀 하나 사는 것도 부담스러울 지경이다.
때문에 외식이나 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처지지만 시집온 지 이제 갓 1년이 돼가는 아내는 남편이 약속한 대로 곧 베트남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한국으로 시집 온 후 향수에 시달리는 외국인 주부들 대다수는 정씨의 아내처럼 고향에 가는 일을 유일한 희망이자 꿈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내들의 이같은 희망 탓에 남편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캄보디아 처녀와 결혼을 한 김인혁(51. 가명)씨는 "처가에서 바라는 게 너무 많다"면서 "장인은 오토바이 사달라고 하지, 처제는 컴퓨터 사달라고 하지, 한 번 가면 돈 몇 백은 그냥 날라간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내년에 베트남에 가기로 아내와 약속을 했다는 박정길(47, 가명)씨도 "베트남 한 번 가려면 적어도 삼백은 든다"면서 "정부에서 비행기 값이라도 보조를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며 하소연했다.
먼 타국에서 신부를 데려오긴 했지만 기초적인 생활수준도 유지 못하는 처지에 처가 살림까지 떠맡게 된 형국이니 남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국제 결혼을 하는 농촌 총각의 20%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 한 몸, 내 가정만 돌보면 되는 서울의 산업연수생들이나 원하면 식당에서 설겆이라도 할 수 있는 서울의 외국인 주부들과는 달리 농촌 국제결혼 가정은 이같은 경제난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농촌은 일감 자체가 없는 까닭이다.
결혼으로 인해 한 개인에서 이제는 가정으로까지 확산된 빈곤의 그늘. 어쩔 수 없이 돈보따리를 싸들고 결혼정보업체를 찾는 농촌의 40대 총각들은 이 가난이 자식에게까지 물려질까 벌써부터 절망한다.
춘천CBS 심나리 기자 aslily@cbs.co.kr
C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