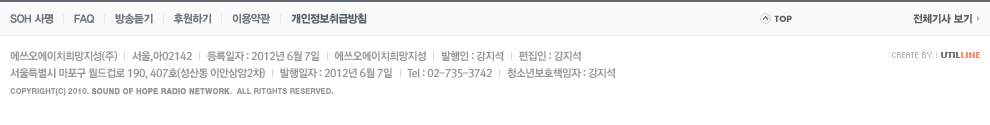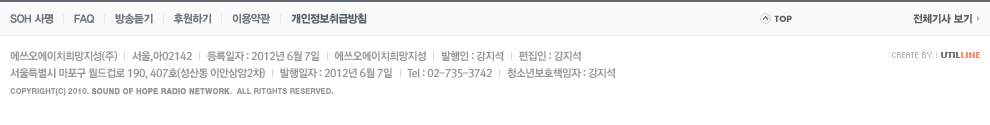뿌리 잊을 수 없지요"…대구 찾은 ‘까르이츠’후손들
계명대서 한국어 배우기 구슬땀
"똑같은 단어인데도 쓰이는데 따라 의미가 다른 말이 너무 많아 한국어를 배우기가 힘들어요."
4일 오전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 어학당. 19명의 남녀가 한국어 공부에 열심이었다. 어눌한 발음으로 우리말을 되뇌이는 사람부터 능숙한 대화를 하는 이들까지, 수준은 천차만별이지만 눈빛만은 모두 생생했다.
검은 머리색과 검은 눈동자, 구릿빛 피부. 보기엔 영락없는 한국 사람이지만 이들 모두는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사범대학 한국어학과에 다니고 있는 '까르이츠(러시아어로 한국인이라는 뜻)' 3, 4세들이다.
이들은 지난 달 10일 수천리를 날아와 대구에 발을 내디뎠다. 벌써 한 달 가까이 계명대에서 한국어와 컴퓨터, 한국 문화체험 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이다. 이들이 한국에 오기까지는 수천만 원의 사재를 턴 위현복 ㈜리서치코리아 대표의 힘이 컸다.
위 대표는 "지난해 사업 차 연해주에 갔다가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고려인 3, 4세들이 많은 것을 보고 이들을 초청하게 됐다."며 "다음 달 7일에는 '우리 함께 운동본부'를 설립, 동아시아 국가에 살고 있는 재외 동포들의 후원과 한국문화, 한국어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까르이츠들의 '한국 사랑'은 여느 한국인 못지 않게 열정적이다. 연해주 출신인 샤샤(25) 씨는 자신의 한국이름을 직접 '진수'라고 지었다. 조부모와 어머니가 고려인이라는 그는 한국이 너무 좋아 다니던 대학도 자퇴하고 다시 한국어과가 있는 대학으로 진학했단다. 그는 "연해주에 사는 러시아인 친구들도 한국이름인 '진수'로 부른다."며 즐거워했다.
김갈리나(19·여) 양은 "친구들 중 비자를 가장 먼저 발급받았을 정도로 한국에 오고 싶었다."며 "정체성에 대한 고민 끝에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까지 포기하고 한국어 공부에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 초이블라직(21) 씨도 "조부모와 부모님 모두 고려인"이라며, "한국은 세 번이나 와봤지만 올 때마다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 비결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다. 불과 40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한국의 저력을 배우고 싶다는 것. 때문에 이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도 "전자산업의 메카인 경북 구미공단"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을 인솔한 김군수(49) 목사는 "고려인은 소련이 붕괴 되기 전까지는 한국과 왕래가 없어 자신들이 러시아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며 "러시아 개방 이후 많은 정보를 접하고서야 자신의 정체성을 찾겠다는 고려인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